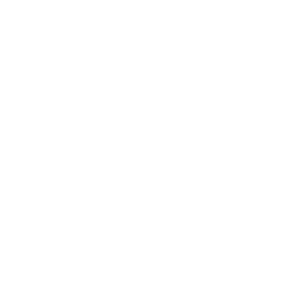건축의 역사(建築의歷史) 또는 건축사는 건축의 한 분야인 동시에 역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건축사는 문화사, 미술사, 기술사, 사회사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건축사에서 고딕, 르네상스 등 양식의 변천을 다루기는 하나, 건축물만 독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양식은 어디까지나 개별 건축물의 결과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상황 등의 시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건축의 역사는 다양한 전통, 지역, 중요한 양식의 유행, 시기에 따른 건축의 변화를 추적한다. 건축의 하위 분야는 시민건축, 종교건축, 조선공학, 군사건축,[1] 조경 등이 있다.
남서아시아에서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10,000년 직후에 레반트에서 등장했고(토기 이전 신석기 A(:en:Pre-Pottery Neolithic A))와 토기 이전 신석기 B(:en:Pre-Pottery Neolithic B)) 동쪽과 서쪽으로 퍼졌다. 기원전 8000년에 남동쪽 아나톨리아, 시리아, 이라크에 초기 신석기 문화가 있었고, 식량을 생산하는 집단이 처음으로 기원전 7000년 경에 유럽 남동쪽에서, 기원전 5500년 경에 중앙 유럽에서 등장했는데 이 중 스타체보-쾨뢰시-크리스(:en:Körös culture), 선형도기문화(en:Linearbandkeramic), 빈카(en:Vinča)를 포함하는 최초의 문화 집단들이 있었다. 안데스를 제외하면, 지협 콜롬비아 시대(:en:Isthmo-Columbian area)와 중앙아메리카 서부(그리고 오대호 지역에서 몇 개의 청동 손도끼와 창의 머리), 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사람들은 서구와의 접촉 이전까지 신석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2][3][4][5]
레반트, 아나톨리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북부, 중앙아시아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단한 건축가였고, 집과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흙벽돌을 이용했다. 차탈회윅의 집들에는 회반죽이 칠해지고 사람과 동물이 등장하는 정교한 그림이 그려졌다. 지중해 몰타의 신석기인들은 거석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유럽에서는 초벽(:en:wattle and daub)으로 만든 롱하우스(:en:Neolithic long house)가 지어졌다. 정교한 무덤도 건설되었는데 특히 아일랜드에 많이 지어졌고, 수천 개의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의 신석기인들은 망자를 위해 장분(:en:long barrow)과 돌방무덤을 지었고 커즈웨이드 인클로저(:en:Causewayed camp), 헨지(en:henge) 부싯돌 광산, 커서스(en:cursus) 유적지 등이 남아있다.





한국의 건축 기술에 비해 발달되고 효율적인 미국 모델은 전통적인 건물, 건축 기법, 현지 자재 사용 및 현지 토속 스타일을 유지하는 토목 및 농촌 건축과 함께 중요한 한국의 새로운 건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착취적 식민화와 내전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특별한 스타일이 없는 임시 건물이 반복적으로 확장되고 단순하고 값싼 소모성 건물의 공장 시스템이 탄생했다. 1950년대 중반, 농촌 지역은 자금이 부족했고, 도시 지역이 넘쳐났고, 도시 스프롤 현상이 두드러지게 중요한 건물을 지을 돈이 거의 없이 시작되었다.
숭례문의 야경
돈과 수요가 허용하는 한 건물은 최대한 빨리 지어졌지만 그 안에 개인의 정체성은 없었다. 건축가는 대부분 미국에서 훈련 받았으며, 지역 사회의 외관과 느낌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미국의 디자인, 관점, 방법을 가져 왔다. 노동자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한옥 마을은 파괴되고 수백 채의 단순한 값싼 아파트가 매우 빠르게 지어졌으며 도심 주변의 베드타운은 회사 주택으로 성장, 건설되었고 자금이 조달되었다. 미적 감각을 보이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단순한 고속 주택에 대한 이러한 절박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도심을 특색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일과 생활을 위한 둔탁한 콘크리트 타워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값싼 자재로 재건된 지역 이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이 가능했다면 계획을 위한 시도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전통적인 건축이 계속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건축이 있었지만 전통 건물들을 포함한 건물들은 미적 감각이 부족하고 디자인 감각이 제한적이며 이웃이나 문화에 통합되지 않았다. 한국이 스포츠 문화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면서 기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빠르게 다가왔다. 스포츠 건축이 한국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